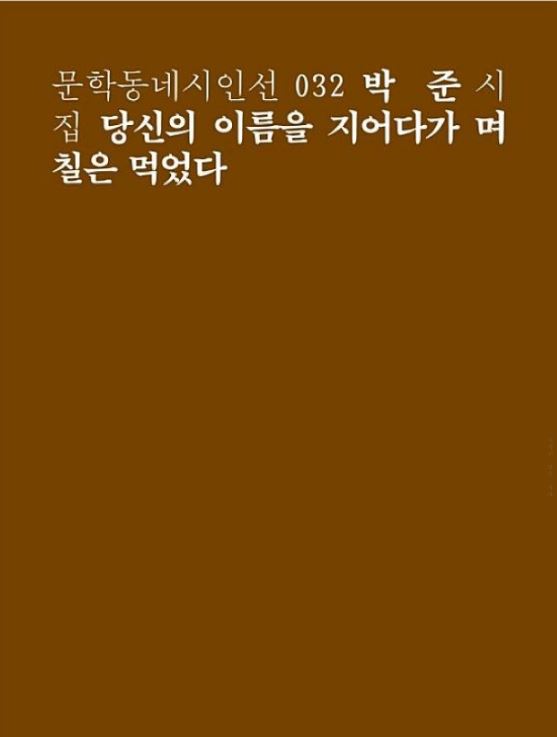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명확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시집을 읽을 때면 한 구절, 한 단어를 몰라 당황할 때가 많다. 반대로 시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겹쳐보며 미소 지을 때가 있다. 시집을 읽는 것은 과거의 내 감정의 해설서를 보는 것 같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독서를 하고 있노라면 시집만큼 짬을 내어 읽기 좋은 책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가 혼자 놀 때 시 한편, 물이 끓는 사이에 또 한편, 세탁기를 돌리는 중에 두어 편. 그러나 한 나절이 지나도록 한편의 시를 읽지 못할 때도 있다.
‘박준’의 시는 이러한 간극이 더 컸다. 작가와 비슷한 나이를 가졌으나 시를 읽다 보면 부모 세대의 감정이 튀어나와 공감하기 힘들 때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읽었으나 느끼지 못하는 시였다. 내가 지나온 과거이지만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그때의 나처럼 아직 더 곱씹을 시간이 필요한 ‘시’이다.
곱씹다 보면 내가 모르고 지나친 순수함과 마주 치는 기회를 얻는다. 내 정서의 부족으로 공감하지 못한 시라도, 되새김질하며 시에 기대면 그 감정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기억하는 일’의 치매 노인이 구청 직원이 올 때 온전한 정신이 돌아 오는 것처럼, 시를 통해 온전한 감정을 배워갔다. 덕분에 새롭게 떠오른 나만의 순수한 서정적 감정이 존재함을 알게 되기도 했다. ‘옷보다 못이 많았다’고 말하는 시인의 말처럼 지금은 ‘박준’이라는 시인의 감정의 못이 더 많지만, 서정적 순수함이라는 옷을 새로이 하나 걸었듯 공감하고 느끼는 시를 더 걸어 보고 싶다.
시집을 읽으며 과거 묻어둔 감정을 다시금 다시 열어보고 못에 걸어 놓기도 했다. 먼저 ‘꾀병’ 속에서는 미인이 내안의 또 다른 자아로 생각 되었다. 가끔 도망치고 합리화 하는 내가 뜨끔하며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작가도 자신의 남모를 진심을 표현한 것으로 들렸다. 작가의 유머 감각에 웃기도 했다. ‘야간 자율 학습’의 제목과 내용의 역설적인 유머는 시를 읽은 후에도 잠들기 전 생각이 떠올라 웃을 수 있었다. 또, ‘마음 한철’을 읽으며 옛 연인을 떠올리기도 했다. 나도 그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음에 마음 한편에 동백이 피었다.
이렇게 시를 읽으면 나조차 묻힌 장소를 몰랐던 감정을 찾아내는 것이 좋았다. 내가 느꼈던 감정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즐거웠다. 이러한 것이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의 매력이라 보인다. 어떨 땐 적나라하고 어떨 땐 두루뭉술한 나의 감정이 시를 읽으며 선을 긋는다.
'개인 취미 > 독서 감상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기 앞의 생(에밀 아자르=로맹 가리) - 문학동네 (0) | 2022.10.26 |
|---|---|
| 다이브(단요) - 창비 (0) | 2022.10.26 |
| 파과(구병모) (0) | 2020.10.22 |
| 역사의 쓸모(최태성) (0) | 2020.10.16 |
| EBS 대입 자기소개서 바이블(실전편) (0) | 2020.07.29 |